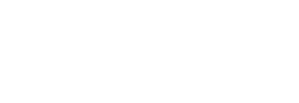|
광주경총, 『2016년 경영자 경제전망 조사』결과 발표 광주경영자총협회(회장 최상준)가 년 초에 회원기업 66개사(제조업)를 대상으로 「2016년 경영자 경제전망 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금년도 경영계획의 방향성을 ‘긴축경영’으로 잡고 있는 기업이 절반이었으며 새해 투자 및 고용계획도 전년도 보다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분석되어 올해도 지역경제가 어려울 전망이다. 금년도 기업경영의 주된 애로요인으로 ‘대외 경제 침체 및 불확실성’을 꼽았고,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‘노동시장 유연성 제고’와 ‘적극적 규제 완화’를 들었다. 또한 노동개혁 중 최우선 과제는 ‘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’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 2016년 경영기조, 「긴축경영」 50.0% < 2016년 경영계획 기조 >
응답자 63.6%, 「現 경기상황은 장기형 불황」, 50.0%, 「상당기간 회복 어려울 것」 ○ 응답자의 63.6%는 現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해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現 경기상황을 ‘경기 저점’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80.3%(‘경기저점’16.7%+‘장기형 불황’63.6%)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, ‘경기저점 통과 후 점차 하락중’ 12.0%, ‘경기저점 통과 후 회복 국면으로 진입’했다는 응답은 7.7%에 불과했다. ○ 한편,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묻는 설문에 50.0%가 ‘상당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’이라고 응답했다. ‘2018년 이후 회복될 것’이라는 응답이 24.2%, ‘2017년에 회복될 것’이다는 19.7%, 2016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다는 6.1%였다. < 현 경기상황 평가 >
<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 될 시점 >
○ 금년도 투자 및 채용계획을 묻는 설문에 대해 ‘작년 수준 유지’가 절반(투자 49.2%, 채용 50.0%)정도였고, ‘투자 축소’가 29.3%(대폭 축소 12.3% + 소폭 축소 17.0%)로 투자확대 21.5%(소폭 확대 21.5% + 대폭 확대 0%)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채용계획도 축소가 31.2%(대폭 축소 10.9% + 소폭 축소 20.3%)로 확대 18.8%(소폭 확대 18.8% + 대폭 확대 0%)보다 높게 나타났다. ○ 금년 투자와 고용계획 모두 ‘확대’ 보다는 ‘축소’를 계획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 < 2016년 투자 및 채용계획 >
경영의 주된 애로요인으로는‘대외 경제침체 및 불확실성’,‘높은 임금 및 노사관계 불안’순 ○ 금년 기업경영의 애로요인으로 ‘대외 경제침체 및 불확실성’이 45.8%로 가장 높게 집계되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이 반영됨. - 그밖에 ‘높은 임금 및 노사관계 불안’23.7%, ‘내수부진’22.9%, ‘투자를 가로막는 진입 규제’6.1% 순으로 나타남. < 기업경영의 주된 애로요인 >
○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‘노동시장 유연성 제고’(25.7%)와 ‘적극적 규제 완화’(25.7%) 응답이 높았다. - 다음으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(20.6%), 투자 및 창업에 대한 금융·세제지원(11.8%)순으로 나타났다. <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 >
노동개혁 중 최우선과제 「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」 ○ 응답자의 29.4%는 노동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‘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’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‘대·중소기업간 근로조건 완화(25.4%)’였다. 이밖에 ‘정규직 과보호 완화’(11.9%), ‘비정규직 처우개선’(11.1%), ‘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’(10.3%) 순으로 나타났다. < 노동개혁 중 최우선 과제 >
노동개혁의 성공추진여부 52.5%가‘회의적’ ○ 지난해 9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룬 노동부문 개혁에 대해 ‘회의적이다’라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하는 52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‘성공적으로 촉진될 것’이란 응답은 21.3%였다. - 특히 ‘회의적이다’라고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‘노사간 신뢰부족’(29.0%)이 가장 높았으며,‘사회적 공감대 부족’과‘정치권에 대한 불신’이 각각 26.3%로 나타났으며 ‘정부의 리더십 부족’이 18.4%였다. <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여부 >
< 노동개혁 성공적 추진 회의적인 이유 >
|